시나브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어쩌면 내 마음이 그랬던 것 같다. 공통점이라곤 거의 없어 이 작은 캠퍼스 안에서도 마주칠 일 조차 흔치 않았던 우리, 그랬건 우리가 우연찮은 어떤 기회로 하나의 공통분모 위에 서로 다른 분자로서 올라섰다.
네가 그랬듯이, 그 시작엔 나 역시도 사실 큰 감흥이랄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공통분모 하나가 우리 분자들을 서로 부대끼게 하는 시간이 참 많았더라. 이미 꽤 오래 전 일이 돼버린 이야기지만, 그 때나는 내 시간과 여유를 포기하고 당신들과의 시간을, 그리고 봉사를 감수해야할 자리였다. 비단 나 뿐 아닌 우리 모두가 그랬었지. 그만큼 첫 만남에 서로 수줍고 어색하게 마주 앉았던 우리들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친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조금 편한 사이가 된 후로는 그 흔한 남사친, 여사친 하는 관계들처럼 서로 장난도 치고, 그러다 실수로 선을 넘어 서로의 마음에 크고 작은 생채기 따위도 안겨주고, 다시 화해하고 웃는 얼굴로 마주하곤 하는 관계가 지속됐었다. 개중 어느날 내가 네 앞에서 어디서 본 누가 참 예쁘다는 칭찬을 하다가, 그에 비하면 넌 참 인간적이라서 좋다는 말을 했을 때 네가 짓던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해. 나름 장난이라고 던진 말에 사람 마음이 크게 상할 수가 있다는 걸 내 삶 중에 그 순간 가장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당시 스물하나라는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나이에. 그렇게 너와 서로 사이좋게 티격태격 하던 1년.
그 이듬해 나는 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해서 시간이란게 차고 넘치던 시기. 학교를 다니던 때만 해도 이런저런 일로 괜스레 실속없이 바쁘기만 하던 나에게 조금 갑작스럽게 주어진 여유와 시간은 많은 고민과 생각, 곱씹을 추억거리들을 낳게 했고, 그 중에 하나하나 깊지는 않지만 흐드러진 얕고 작은 조각들에 너라는 사람이 은은하게 묻어있더라. 그걸 깨닫고 나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는 더더욱 없었지. 시간이 남아 멍하니 빈 공간을 바라보던 때에, 무심코 목적어도 없이 '보고싶다' 라는 말을 읊조리던 나였던걸. 그런데 만나보긴 커녕 연락 한번 못해봤어. 솔직히 그간 좋아했던 사람, 그렇게 많던 와중에도 변변찮은 고백 한번 못해보고도 하나같이 실패만 겪었던 내게, 뭣보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내게 그런 감정은 사치라고 여겨졌으니까.
결국 딱 입대하는 날, 난 그 전까진 내색도 없다가 갑작스레 '나 간다' 라는 이야기만 네게 메시지로 남기며 쿨한 척을 했고, 입영하는 보충대 안에 가져가는 내 개인 수첩 속에 적어놓은 연락처들 중 네 것은 있지도 않았다. 그러고서 들어간 훈련소에선 그 때 그 선택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 선택과 결심이 무색하게 자대배치 받고 나서는 허구헌날 네게 전화며 메시지며, 그러다 휴가만 나가면 시간 좀 내서 만나달라고 너를 매번 졸랐으니까. 그런 내 부탁을 거절 없이 들어주던 네가, 영화 한편 보고 밥을 같이 먹어주던 네가 어쩌면 내가 군생활을 버티게 해준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다. 이 거지같은 경험 끝에는 너한테 떳떳하고 멋진 남자가 돼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나처럼 휴가를 나와서 너랑 만나 함께하던 식사 중 넌 내게 이전엔 한번도 안 하던 남자얘기를 하더라. 있잖아, 연애상담 비슷한 거. 그런 걸 네 입에서 듣는게 내겐 너무 생소하고 불안했다. 그것도 하필 내가 이제는 네게 고백하기로 마음 먹었던 날에, 하필이면...
그렇게 너와 다른 약속이 있던 이틀 뒤로 디데이를 더 미루며 그 날 헤어지기 전엔 꼭 고백해야지, 하다가 달라붙은 입을 떼어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등돌린 뒤,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네게 고백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1시간을 넘게 걸려 도착한 집에서 네 답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 꽤 상투적이었어. 고맙지만, 친구로 남았으면 한다고 했었잖아 너. 근데 다 이해가 가더라. 난 내가 보기에도 친구 이상으로서의 매력을 갖춘 남자는 아니었고, 당시 우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네 상황은 내가 거절당하리란 걸 스스로도 너무 쉽게 예측하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있는 힘껏 던진 고백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고, 어떤 식으로든 너와는 결말을 보고 싶었어. 결국 남 같은 사이가 돼 이제는 졸업해서 학교를 떠난 네 소식은 들을 방법조차 없네.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하고싶은 말은 이거 하나야. 고마웠어, 진심으로. 사람을 마주하는게 서툴고 철 없던 내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배려하는 법을 터득하게 해준 사람이 너였어. 너에게도 과연 나를 떠올릴 추억거리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되도록이면 좋은 기억었으면 좋겠네. 두서없이 길었던 글 이제 마무리 할게.
이젠 안녕, 잘 지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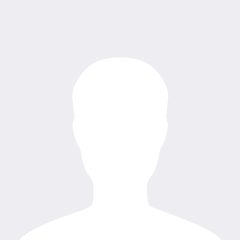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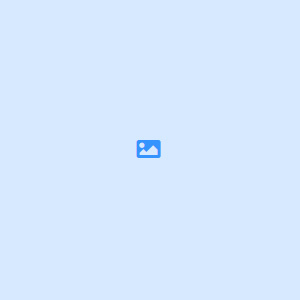

0개의 댓글